막무가내 어원
‘달리 어찌할 수 없음’, 혹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도가 없음’ 등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막무가내는 우리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자어, 혹은 한자어와 우리말의 혼합형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 국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막무가내라고 한글로 쓰면서 그것이 한자어에서 왔다는 의미로 莫無可奈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런 한자 단어 자체가 중국에서는 없는 것인 데다가 조선시대까지의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계로 과연 이 표현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막무가내가 모두 한자어인지, 아니면 일부가 한자어이고 일부는 우리말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말의 맨 앞에 있는 莫(아닐 막)과 두 번째 글자인 無(없을 무)가 두 개의 부정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뜻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 일단 막무가내가 한자어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쓰임새를 살펴보도록 하자.
글자의 모양과 유래로 볼 때 莫은 풀숲에 해(日)가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한다. 莫는 해가 넘어가는 때를 나타내는 暮(저물 모)의 원래 글자가 된다. 그래서 莫은 어두침침하다.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등의 뜻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다가 원래의 뜻을 暮에게 넘겨주면서 다양한 용법을 가진 것으로 용도와 의미가 확장되면서 대명사, 부사, 명사, 형용사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글자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아무도~않다, 누구도~않다, 무엇도~않다(없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막무가내에서 莫은 ‘아니다’라는 부정(否定)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대명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부정의 의미를 한층 노골적으로 나타내는데, ‘아니다’, ‘없다’ 등의 의미를 지닌 不(아닐 불)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등으로도 사용되지만 ‘막무가내’에서 쓰인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풀이는 생략한다.
존재하던 무엇인가가 불에 타서 없어진 상태(亡)를 나타내는 글자인 無(없을 무)는 갑골문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하늘에 제를 올릴 때 제사장 같은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舞(춤출 무)가 원래의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를 지나면서 가차(假借) 되어 그 쓰임새가 확장되었고,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구실로 쓰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無는 기본적으로 존재의 부정을 나타내는 뜻을 기본으로 하는 글자가 되었다. 다만 원래부터 무엇인가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不과는 달리, 있던 것이거나 있어야 할 것 등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중심적인 구실로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막무가내’에서는 可(옳을 가)와 결합하여 ‘가능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도의 뜻으로 된다. 또한 무내하(无奈何)로 되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 등의 뜻으로 되기도 한다.
奈는 ‘奈何’의 줄임말이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을 나타내면서 반어적인 의문을 표시하여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정도가 되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된다. 어찌할 방법, 혹은 방도가 없다 정도의 뜻을 강조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독자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관계로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중심이 되는 글자가 나타내려는 뜻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그래서 문장 중에서는 ‘어찌’, ‘어떻게’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풀이해 놓고 보면 막무가내는 가능한, 혹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극에 달했다는 뜻으로 되어서 莫이 뒤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뜻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면서 강조하는 구실로 쓰였다고 풀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莫의 용법으로 볼 때 상당히 억지스러운 데가 있다. 한문에서 莫은 이런 용법으로 쓰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막무가내를 완전한 한자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한자어이면서도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20세기 바로 앞 조선시대까지의 어떤 기록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한자어인가 하는 의구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맨 앞의 ‘막’이다. 나머지 뒤의 세 글자는 굳어진 표현으로 한자어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막무가내에서 ‘막’을 한자어로 보느냐 우리말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가지는 뜻과 어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는 한자라는 전제로 살펴보았으니, 아래에서는 ‘막’이 우리말이라 가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막’은 ‘마구’의 준말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주 심하게’, ‘함부로’ 등의 뜻을 기본으로 하는 부사(副詞)이다. 그러므로 ‘막’은 뒤에 오는 말의 뜻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충함으로써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구실을 중심으로 한다. ‘막무가내’에서 ‘막’을 우리말로 본다면 막+無可奈로 되는데, 무가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의 ‘막’은 뒤에서 말하려는 것을 한층 크게 강조하기 위해 쓰는 부사어인 ‘정말로’, ‘진짜로’ 등의 뜻이 된다. 즉, 막무가내는 ‘정말로 어찌할 방법이 없음’이라는 뜻이 되어 강하면서도 세차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취향에 잘 맞는 표현으로 된다.
막무가내가 조선시대까지 어느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말은 20세기 무렵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莫無可奈로 표기하고 있어서 막무가내가 우리말+한자어인지, 한자어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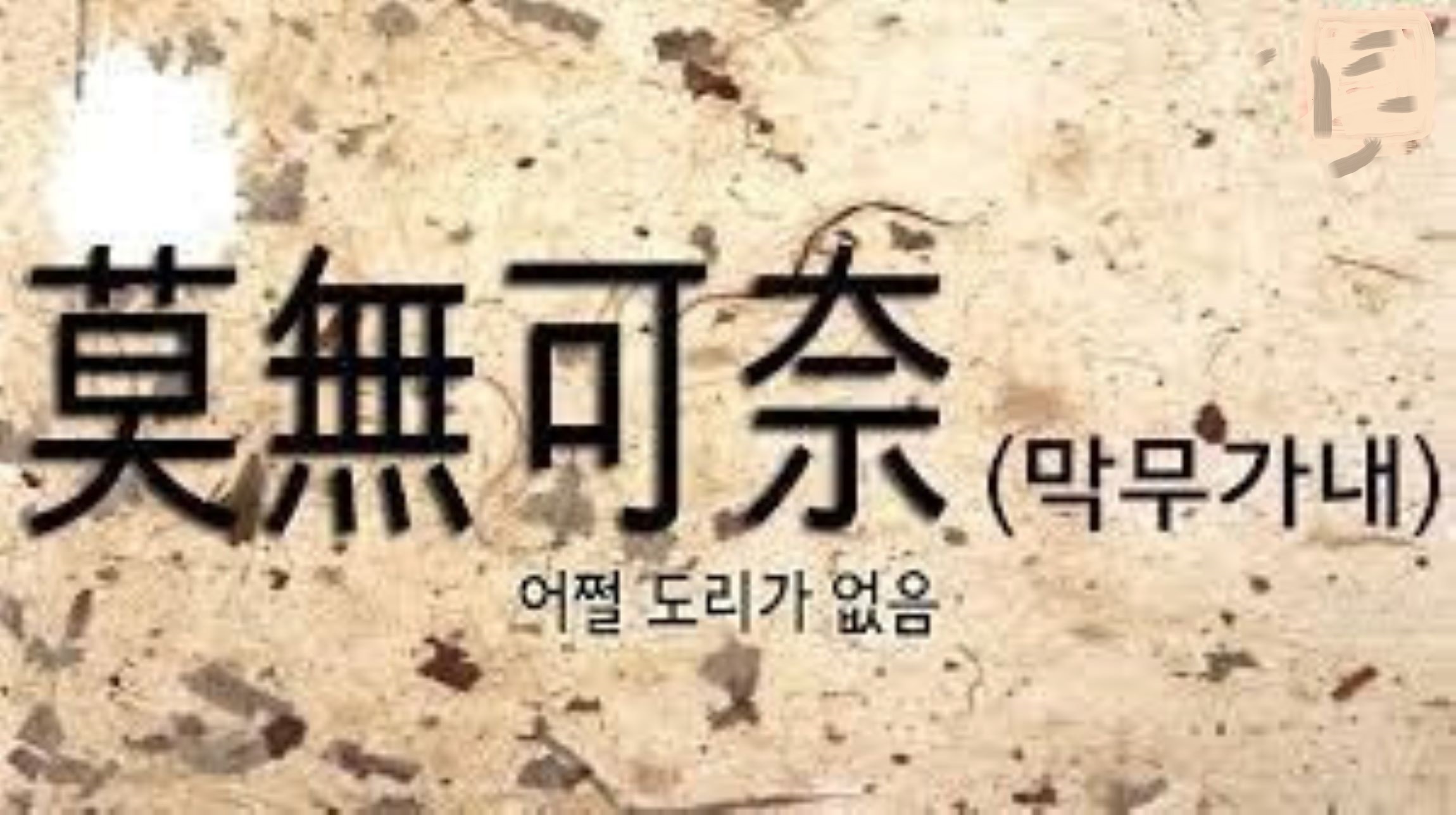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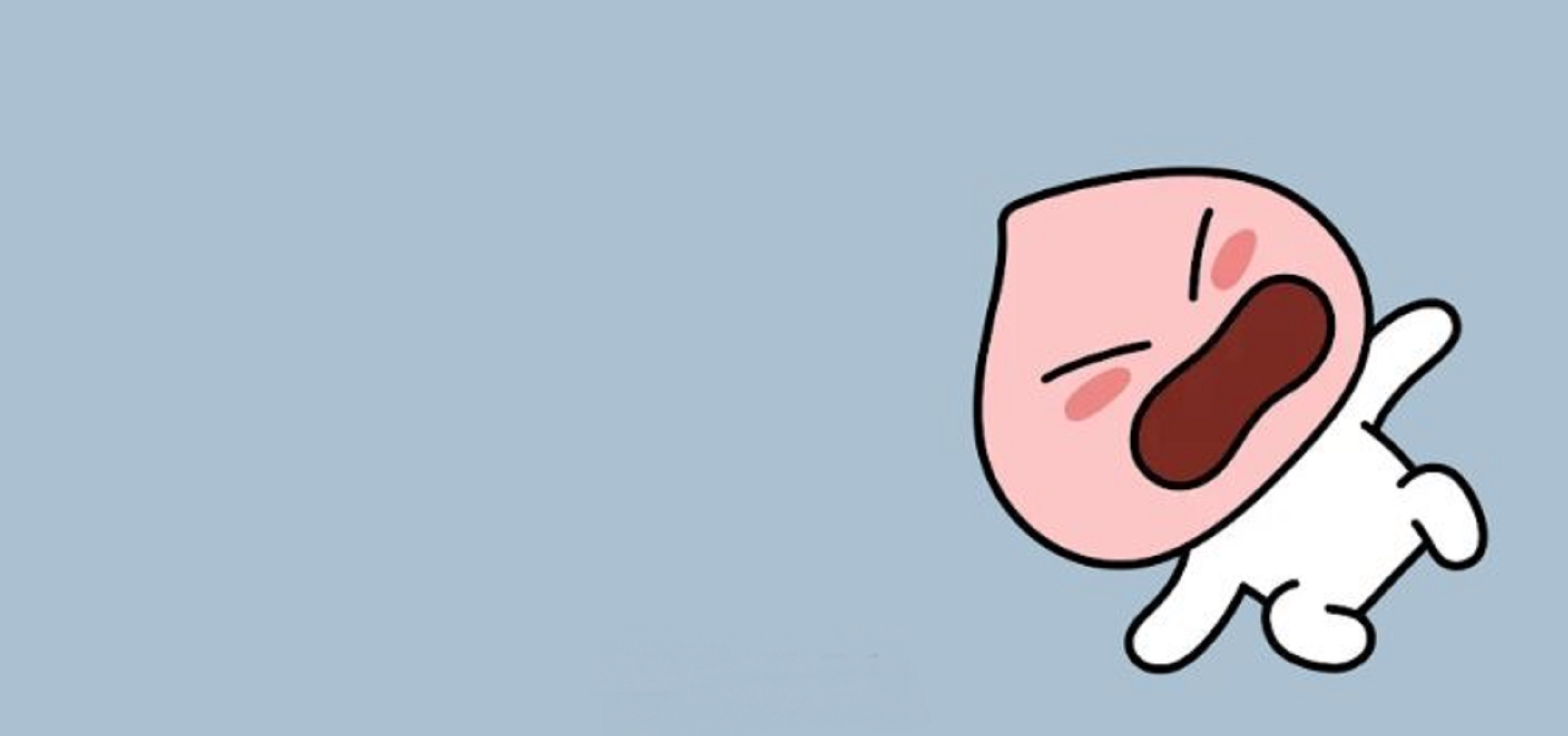

'문화의세계 > 재미있는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질없다 어원 (0) | 2025.02.12 |
|---|---|
| 짐승 어원 (0) | 2025.01.24 |
| 묵사발 어원(묵사발이 되다) (1) | 2025.01.07 |
|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차이 (0) | 2024.11.30 |
| 뜨내기의 어원 (0) | 2024.11.17 |



